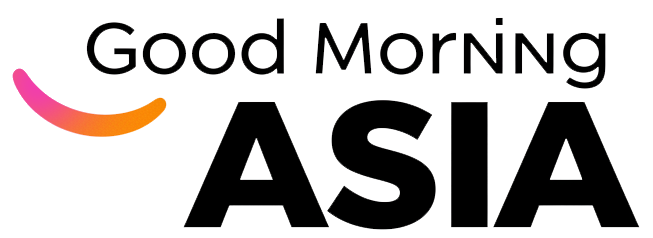일본에서 한국 혐한이 눈에 띄게 감소한 이유! 2025년 10월 08일 08:55
페이지 정보
본문
일본에서 한국 혐한이 눈에 띄게 감소한 이유!
일본 사회 전반의 한국에 대한 '혐한' 분위기가 과거 대비 눈에 띄게 약화되거나 성격이 변화한 배경에는 '세대 교체에 따른 인식의 변화'와 'K-컬처(한류)의 압도적인 확산', 그리고 '한국의 국력 신장에 대한 현실 인식'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혐한 분위기가 감소한 주요 이유
1. K-컬처(한류)의 강력한 확산과 민간 교류 증대
혐한 분위기 약화의 가장 강력하고 가시적인 원인은 K-컬처의 폭발적인 성장과 일본 젊은 세대(MZ세대)의 적극적인 수용에 있습니다.
과거 '욘사마' 시대의 한류가 '노스탤지어(향수)'의 대상이었다면, 현재의 K-POP, K-드라마, K-뷰티, K-패션 등은 '닮고 싶은 첨단 선진 문화'로 인식됩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한국을 트렌드에 민감하고 힙한 문화 발신지로 여기며, 한국 패션을 참고하고(20대 응답자 69%),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일본 기성 언론이나 지배층이 만들어낸 왜곡된 혐한 프레임을 우회하여 한국 문물을 직접 접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까지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고(특히 젊은 층에서 방한 의향이 높음),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이 성업하는 등 실제 교류와 체험을 통해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 갈등이 첨예할 때에도, 젊은 층은 '한국은 싫지만 한드는 좋아'와 같은 '정치와 문화의 분리' 성향을 보이며 문화 소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호감이 정치적 반감을 이겨내는 소통과 공생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2. 세대 간 인식 격차와 혐한 동력 약화
혐한의 주요 동력이었던 기성세대 및 보수층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가 사회 주류로 부상하며 혐한 분위기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혐한 정서는 과거 한국 침략을 위한 지배층의 선동이나, '잃어버린 20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일본의 상대적 지위 하락에서 비롯된 일본인의 열등감, 자신감 상실, 국가적 고립감을 보상하기 위한 '왜곡된 우월감'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특히 보수파 장년층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는 경제 대국 시절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달리 한국의 발전상(선진국, 잘 사는 나라, 문화 선진국)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조건에서 희망을 잃은 일본 젊은 층이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와 경제 성장에 이끌리는 현상도 혐한 분위기 약화에 기여했습니다.
과거 한국인을 대상으로 길거리에서 진행되던 혐한 시위는 실제로는 '아르바이트(스트레스 해소용)'로 고용된 인원이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소수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 및 유엔의 우려 표명 등으로 인해 거리에서의 직접적인 혐한 표출은 감소했습니다.
3. 한국의 국력 신장 및 '선진국' 이미지 확립
한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문화 선진국이자 잘 사는 나라로 인식되면서, 과거 '하층민'이나 '낙후된 이웃'으로 여기던 왜곡된 우월감이 희석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왜곡된 우월감은 현실적인 국력 차이 앞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일본 정부나 기성 언론에 의해 통제되던 한국 관련 정보를 젊은 세대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혐한의 성격 변화
혐한 분위기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길거리 시위 같은 가시적인 혐한 행동은 줄었지만,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와 혐한을 소재로 하는 출판물(혐한 비즈니스)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여 '한국은 힘들구나, 일본에서 태어나 다행'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는 새로운 형태의 혐한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혐한 감정이 일본 사회 내 배외주의, 애국주의와 연결되어 구조화되고, 이를 소재로 하는 미디어와 출판물이 등장하면서 특정 계층의 불만 해소 및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